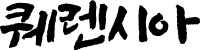똥도 촌수를 안다
등록일03-05-29
조회수162
댓글0
나는 힘들면 투정으로
엄마의 속을 썩혔습니다.
엄마는 아픔을 가슴으로
삭혔습니다.
어느날,
나는 아무거나 주워 먹고
탈이 났습니다.
머리에 열이 펄펄나고
끙끙 앓고있는 나에게
엄마는 우물의 찬물을 길어
수건에 적셔 이마에 얹어 줍니다.
그리고는
팥알,녹두알과 바가지에 찬물을 떠서
그 속에 식칼을 담궈서 갖고 들어옵니다.
돼지나 닭을 잡으려는 듯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어린 나는
두려움까지 느껴집니다.
팥알과 녹두알을 나의 입에 넣고
서슬이 퍼런 부엌칼을 나의 입에
비스틈히 걸칩니다. 그리고는 바가지의
찬물을 입안에 부어넣고 녹두알 팥알을
삼키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주문을
엄마는 외웠습니다. 객고를 먹인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 부엌칼(식칼)을
마당으로 팽개치듯 던졌습니다.
칼날이 밖으로 향하면 귀신이 도망을
간 것이고 칼날의 끝이 집안으로 향하면
귀신이 나에게 붙어있는 징후로 여겼습니다.
어쩌다가 칼날이 집안 쪽으로 향하면
엄마의 성화는 대단하였습니다.
엄마는 온갖 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는 엄마의 객고먹임에
칼날은 삽짝거리로 향하고 나는 조용히
잠이 듭니다.
엄마는 잠든 나를 포옥 이불로 덮어주고
컴컴한 부엌으로 나가 쌀단지를 열고
단지 밑에 조금 깔린 쌀을 긁어 모아
작은 쪽배기에 담아 빈 그릇과 함께
방으로 갖고 옵니다.
엄마는 생쌀을 입에 넣고 꼬옥 꼬옥 씹어서
뱉어 그릇에 담습니다. 한참동안 쪽배기의
쌀을 씹어서 잘게 부수어 그릇에 담은 후
부엌으로 갖고 가서 동솥에 넣고 약간의
물을 부어 미음을 닳였습니다.
잠자는 나를 깨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르스름한 미음을 노오란 생된장과
함께 먹였습니다.
객고먹임의 효험인지 엄마의 정성인지
몰라도 나는 다음날 아침 언제 아팠냐는 듯
말끔히 정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기신 음식도
꺼림직하게 여기고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먹던 숟가락도
더럽다고 얼굴 찡그리는 세태 속에서
옛 정이 그립습니다.
위생적으로 살며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는
여겨지지만 그래도 뭔가 잃어 버린 듯
서운한 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고 했습니다.
연인의 입술에 뽀뽀하듯 그러한 달콤한
사랑이 생활 속에 숨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똥도 촌수를 안다'는 어른들이 하시던
말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