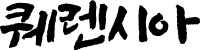나 어릴적에는....
어릴적에는 엄마의 손이 약손이고
가정 상비약이라야 아까징끼(머큐룸)
옥도징끼(요오드딩크)가 고작이었다
어금니를 빼고 나면 냄비에 조선간장을
바글바글 닳여서 숟가락으로 떠서
환부에 머금고 한참 있다가 뱉어내면
소독이 되고 아픔도 덜한 것 같았고..
소꼴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이면 마른 흙에다가
상처부위를 문지르고 쑥잎을 따서 돌로 찍어
환부에 대고 꼬옥 눌러있으면 지혈이 되고
2차 감염이 되지 않았다.
감기가 걸려서 콜록거리면 어머니는
장에가서 생엿을 사와서 콩나물 시루에
자라고 있는 콩지럼을 다듬어 그릇에 넣고
생엿을 식칼로 깨어서 함께넣고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 몇시간을 재워 두면 엿에 절여진
콩나물 물이 나와 달콤한 꿀물로 되어있다.
이 물을 마시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훨씬 기침이 덜나고 몸이
부드러워진 기분이 든다.
둘째 조카놈은 돌이지나도 잠에서 깨어나면
그냥 일어 앉아 노는 것이 아니고 눈만
뜨면 울음부터 터뜨리고 좀처럼 그치지를 않는다.
얼루고 달래도 그냥 엉 엉 눈천에 눈물도 안 나면서
소리를 질러쌴다.. 몬땐 왕거이 꿀밤 한방을 주고
싶어 이마를 콕 지어박아버리면 자지라지도록 운다
저그 엄마는 아침밥을 짓는다고 울어도 돌볼 시간이
없고 우리 어머니(조카할매)가 우리손자 누가 울리노
카면서 엎고 엉덩이를 토닥 토닥 두드려도 막무가내다
그러면 내려놓고 다리위에 앉혀서 ..
알강달강 서울 가서
밤을 한밤 실어다가
미꿈빠진 통에 넣어놨더니
이놈의 뒷집 할마시가 와가지고
다까먹어뿌고
단지 두개 남았는거
껍데기는 아지아 주고
보니는 할배 주고
우리둘이 알찌미 먹제이~~
카면서 앞으로 꺼덕 뒤로 꺼떡이면
그제서야 삥그시 입이 벌어지는 조카놈..
요즘이야 장난감도 많고 먹을 것도 많지만
여름이면 우물의 시원한 찬물에다가 물밥
만들어 된장에 고추를 찍어 먹는 것이 최고였고
조카들은 맨밥에 물말아서 사카린을 넣어서
주면 맛좋다고 먹던 것이 눈에 선하다
바람이 불어 눈에 티가 들어가면 눈이 아리고
따갑다. 그냥 손등으로 부비면 눈물만 나고
아려서 눈도 뜰수가 없다. 그러면 달려가는 곳은
병원이 아니라 엄마한테다. 엄마는 손으로
눈에 살짜기 덮고서..
깐차.. 깐차.. 니 아들 통시물에 빠진거
건져 주께 내 아들 눈에 티든거 빼내도고.. 헛세!
주술을 외우듯 반복하여 말하면서 살살 눈을 스다듬으면
깜쪽같이 눈에 들었던 티가 빠져 나왔던 기억을
아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것으로 사료되와
표준말로 풀이하자면...까치야.. 까치야..
네 아들 변소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을 건져 줄테니
내 아들 눈에든 티를 빼내 주려무나...)
어린 시절에는 먹을 것도 풍족치 못했지만
뱃속에 기생충도 많이 넣어서 다녔다. 비 위생적으로
생활해서인지.. 국민학교 때 기생충 검사를 하면
회충,요충 등 기생충이 없는 학생이 드물었다.
회충약 산토닝을 선생님이 나누어 주면 먹고는
회충이 몇마리나 나왔는지 선생님께 보고해야 했다.
헤아려 보자면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다.
푸덩덩! 빠져버린 대변 속에 몇마리가 숨어있는지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밭고랑이나 신문지를 깔아놓고
변을 보고는 꼬쟁이로 휘집어 수를 헤아려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그런데.. 이게 뭐람!! 회충이 엉덩이
중간쯤 나와서 아무리 간심을 써도 달랑달랑 달려
있으면 징그러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맘만한 것이
엄마라고 목이터져라 엄마를 부른다. 엄마는 더러움도
모르는지 손으로 잡고 빼내어 던져 버린다. 엄마도 어찌
더러움을 모르겠냐마는 자식의 똥을 더럽다 생각 않고
묵묵히 키우시는 어미의 마음 때문이었으리라..
그 시절... 잠자다가 아침이 되면 배가 자주 아팠다.
회충이 배고프다고 설쳐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엄마가 살살 배를 주물러 주는 약손이 아픔을
달래는 유일한 처방이었고 그 효력은 아직도 따라갈
의사가 없더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