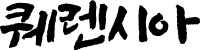미리쓰는 유서
누구를 부를까?
유서에는 흔히 누구를 부르던데?
아무도 없다.
철저하게 혼자 였으니까.
설사 지금껏 귀의해 섬겨온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이다.
이 세상에 올때도 혼자서 왔고 갈 때도 나 혼자서 갈 수밖에 없다.
내 그림자만을 이끌고 휘적휘적 삶의 지평을 걸어왔고
또 그렇게 걸어 갈테니 부를만한 이웃이 있을 리 없다.
물론 오늘까지도 나는 멀고 가까운 이웃들과 서로 왕례를 하며 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생명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것이므로 인간은 저마다 혼자일수 밖에 없다.
그것은 보랏빛 노을 같은 감상이 아니라 인간의 당당하고 본질적인 실존이다.
고뇌를 뚫고 환희의 세계로 지향한 베터벤의 음성을 빌리지 않더라도,
나는 인간의 선의지 이것밖에는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온갖 모순과 갈등과 증오와 살육으로 뒤범벅이 된 이 어두운
인간의 촌락에 오늘도 해가 떠오른 것은 오로지 그 선의지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먼저 인간의 선의지를 저버린
일에 참회다.
이웃의 선의지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은 탓으로 저지른 허물을
참회하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허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는 용서받기 어려운 허물도 적지 않을것이다..
이 다음 세상에서는 다시는 더 이런 후회스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며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 선의지를 저버린 과보라 생각하면 능히 견딜만한 것이다.
"날카로운 면도날을 밟고 가기 어렵나니
현자가 이르기를 구원을 얻는 길 또한 이같이 어려우니라"
<우파니샤드>의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내가 죽을 때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본래무일물은 우리들 사문의 소유 관념이다.
그래도 혹시 평생에 즐겨 읽던 책이 내 머리맡에 몇 권 남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신문이오" 하고 나를 찿아주는 그 꼬마에게 주고 싶다.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 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 보다 한 술 더 떠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 하기는 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
평소의 식탁처럼 나는 간단 명료한 것을 따르고자 한다.
내게 무덤 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 차가운 빗돌 대신 어느 여름날 아침에
좋아하게 된 양귀비꽃이나 모란을 심어 달라고 하겠지만, 무덤도 없을 테니
그런 수고는 끼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버린 육신은 보기 흉하고
이웃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없애 주었으면 고맙겠다.
그것은 내가 버린 헌옷이니까.
물론 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이라면 아무데서나
다비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은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어린왕자가 사는 별나라 같은 곳이다.
의자의 위치만 옮겨 놓으면 하루에도 해지는 광경을 몇 번이고 볼수 있다는 아주 조그만
그런 별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안 왕자는
지금쯤 장미와 시이 좋게 지내고 있을까..........
ㅡ 법정스님 ㅡ
雨 ...잠든 고은 밤 자락에.. 후愛 올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