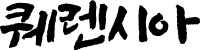어미의 보릿고개2
떨어지지 않는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집어 뜯으며 일어선 새벽
동녘 샛별은 언제나 처럼 사립문 옆 감나무 가지를 타고 논다.
어찌어찌 아침을 때우고...
긴 하루 해를 삿대질로, 욕지기로, 악다구로, 견디고난 저녁.
죽쑬 때 쓸 이런저런 시퍼런 잎사귀 풀들을 한 바구니 캐고, 뜯어 다듬어 놓고 잠자리에 누웠다.
눈을 감는가 보다 했더니 어느새 꿈속.
푸짐한 잔칫상을 받아서 졸라맨 허리끈 풀어놓고 정신없이
거둬 먹고 있는데 멀리서 막내의 칭얼이는 소리가 들린다.
번쩍.. 떴다
분명, 막내가 내는 소리였는데...
곁에 잠든 아이를 더듬더듬 만져 보는데 소스라치게 놀라도록 불덩이다.
웅얼웅얼 헛소리까지 뱉아 내며 고열에 끓고 있었다.
수건에 찬물을 적셔다 닦고 또 닦고...
자꾸만 사지가 늘어져 가는 아이를 두고 볼 수 없어서 들춰 업었다.
읍내 병원으로 마당을 나섰는데 가진 돈이 없다.
'어쩌지? 이일을...'
'그래 그거라도....'
대나무 닭장 속 팔을 넣어 더듬더듬 씨암닭을 잡아냈다
지푸라기 몇 가닥으로 날개를 모아 묶고 보자기에 싸서 옆구리에 끼고 내달은 걸음.
십리 길 읍내 소아병원.
동네 고샅을 나서고. 솔숲 산길을 지나, 논둑길 바람우는 도랑길 지나면 읍내다.
얼마나 단걸음 이었는지 오는 길에 무엇이 있었던가 기억이 없다.
"쾅쾅쾅쾅~!"
닫힌 양철 병원문을 숨도 잊은채 두드린다.
"선생니임~~~~! 의사선생니임~!"
"얼렁좀 나와보시쇼~~"
"우리 애기 다 죽어라~ 얼렁 나와보시쇼~~"
가쁜 숨 몰아쉬며 부르는 내 소리가 신음소리로 메아리져 왔다.
"삐꺼덕~"
병원문이 신경질을 내며 열렸다.
치료를 마치고 시멘트 바닥에 떨궈진 닭을 바라본 의사선생님은
지친 얼굴로 다시 내 손에 풀죽은 닭을 쥐어 준다.
"열 내리고 목줄기 걸린거 끄집어 냈으니 아침에 생글거리면 애기나 잡아서 묵이소~"
"그리고 아짐니도 꼭 같이 묵어야 혀요!"
땀내 나는 등에 붙어서 쌔근거리며 잠든 아이.
보자기에 싼 채로 팔자를 알기나 한듯 소리 없는 씨암닭.
맨발에 검은 고무신 겨우 꿰어 신고 몸베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인 나.
낮에 일하는 동안 밭고랑에 내려놓은 아이가 뜯어다가 입에 삼킨 독새기 풀 때문이었단다.
모자란 젖과 미음 몇 술로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었던가?
저 어린 뱃골 조차도 채워주지 못하는 못난 에미.
"내 어이 너를 퍼질러 낳았던고~~"
"한 번도 불려 주지 못한 뱃골을 잡풀로 채우며 얼마나 이 에밀 원망 했을꼬~~~"
"서방복 없는 년~ 이 기구한 팔자를 어린 니가 알것이냐~ 내가 알것이냐~ 조상님들이 알것이냐~"
새벽 이슬에 젖은 숲길에 울리는
지친 고무신 끌는 소리가 구슬프기 짝이 없다.
닭똥 같은 덩어리 눈물을 뚝뚝 떨구며 돌아오는 어둔 새벽길 하늘에선
은하수 너른 강이 유유히 아침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 風 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