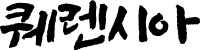어미의 보릿고개
'푸덕~ 푸드득~ 꼬~끼오~~~~! 꼬오오.....'
너머뜸 아지매네 장닭이 훼치며 아침을 알리는 울음이 마치 꿈결인듯 들린다.
구들장을 뚫고 몸은 자꾸만 내려 앉는데...
어린 자식들의 쌔근 거리는 소리를 듣자니 절로 몸이 일어선다.
기울여 기대 놓은 정지문을 삐거덕 열고
입 큰 가마솥에 물 한 통 들이 붓고 아궁이에 솔가리 비벼 넣고
성냥을 그어 불을 당긴다.
엊그제 팔아치우고 남은 머리카락이 나풀거림에 수건으로 둘러 쓰고
부짓깽이로 불쏘시게 들썩여 불을 때는데 따뜻한 불기운이 가랭이를 타고 전신을 돌아 피를 덥힌다.
'무얼로 아침을 때울거나~'
간밤 식량 구해온다던 우라질놈의 서방은 보리 한 되박은 커녕
코가 삐뚤어지게 취해서 들어와 퍼질러 잠들었다.
'믿는 내가 빙신이지~ '
광문을 열고 아끼던 꼬막단지 캄캄한 속을 들여다 본다.
바가지에 밀가루 두 모둠주먹.
양철동이에서 물 퍼 담아 내고
넉넉히 물붓어 밀가루 휘휘~ 풀어 젓으며 낮은 불로 끓인다.
누르딩딩 풀죽.
우물가에 담궈둔 시래기 건져다가 도마에 쫑쫑 썰어 넣고
약간의 된장끼와 마늘을 넣고 큰 주걱으로 젓다보니 제법 구수한 냄새가 맡아진다.
냄새가 퍼지자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눈을 부벼 일어났다.
밥상이라곤 덜렁 막내 머리통만한 히멀건한 무우김치 한양푼에
대접 마다에 훙덩한 풀죽 한 그릇 씩.
세 놈은 눈 부라리고 먹기 바쁜데
그래도 큰놈이라고 "엄니 밥은..." 하고 챙긴다
"난 정지에 할 일 있응께 얼렁 먼저 먹어~"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서 밥상 물려 오기를 기다렸다.
모두가 씻은듯 깨끗한 양재기들...
가만... 큰놈 그릇에 반쯤 남았다.
방문을 나서며 생배가 아프단다.
또 날 생각해서 남겼구나... 울컥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것.
솥 바닥에서 긁어낸 몇 술을 큰놈 밥그릇에 보태서 한끼를 면했다.
해가 당재산 머리맡에서 둥실거리고 또 허리가 휘도록 지쳐나갈
하루가 이렇게 시작 된다.
둘째와 큰놈은 도시락도 못챙긴 가방을 끼고 학교로 향한다.
점심시간 수돗꼭지만 빨아대다 부른배 안고 운동장 한켠에서 한숨만 몰아 쉴텐데....
돌지난 어린것 기저귀로 묶어 업고
6살 넷째를 붙들어 걸리고 방안의 울서방 헛기침 소리를 들으며
함석집 뒤엄내러 마당을 나선다.
밭 언저리
질펀히 깔린 잡풀 위에 어린것 내려놓고 신들린듯 일을 열중 한다.
배고픔도 잊으려
설운 세상사도 잊으려
입술이 자주빛으로 멍들도록 악물고...
오후 새참 시간,
물 한 모금으로 허기를 삼키며 보채는 어린것에 빈 젖 물리며
미치도록 푸른 하늘을 원망스럽게 올려다 보는데
둘째가 팔을 휘저으며 밭고랑을 내질러 왔다.
"어엄니~~~~! 클났어~ 아부지가~ 아부지가 말여~ 헉헉~"
"왜 그려~"
"아부지가여~ 입에서 피가 막 나온다니께여?"
"뭐여? 느그 아부지 어디 계시냐?"
"토방에 쓰러져 부렀어라~"
겉보리 몇 줌을 물에 불려서
학독에 득득 갈아 세번 퍼지도록 불을 때서 강된장에
삐빌삐밀 한 그릇씩 먹여서 얘들을 재우고...
각혈하는 서방 닦아서 눕히고
마루끝에 걸터 앉아 바라본 밤하늘엔 휘엉청 해맑은
서럽디 서러운 고운 달이다.
"어찌 살꼬~"
"어이 할꼬~ 저 어린것들.."
"엄니~ 나 어쩌면 좋다요?"
"굶겨 죽일수도 없고.. 먹여 살릴수도 없고.."
"하늘서 보고 있다면 방법좀 일러주소 엄니~~ "
"엄니~~~~ 나좀 살려주소!"
애궂은 돌아가신 엄니만 불러 원망하며
그렇게 눈물로 지새운 밤.
= 風 磬 =
풍경: 얼마전 적어뒀던 글 '어미의 보릿고개' 몇 편 연재합니다 [01/24-16: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