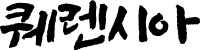어미의 보릿고개 3
간 밤 막걸리 부어서 반죽해 아랫목에 묻어둔 찐빵 반죽으로
금방이라도 해가 불끈 솟아오를성 싶은 동녘을 흘금거리며
동글동글 모양을 만들어내는 손길이 바쁘다.
새참 시간에 늦지 않게 나가야 할 텐데..
가마솥에 잔댓가지 얼기설기 질러 놓고 채반 올려 반죽을 모둠으로 둘러 놓는다.
아궁이에 불을 때며 아침상을 차린다.
무우싱건지 한 사발, 시래기 김치 한 보시기.
죽도 아닌것이 밥도 아닌것이 입에서 돌다 씹힐것 없이 미끈덩 넘어 가는
갈아 삶은 보리밥을 맛나게도 먹어주는 아이들을 보며
난 보리숭늉 양푼 바닥에 남은 물을 들이키고서 아침을 대신한다.
양은 커다란 다라이에
손바닥 만한 찐방을 소복히 올려 담고 그냥 나서려다가 2개를 설겅 위에
학교서 돌아올 애들을 위해 올려 놨다.
내일까지는 큰놈 납부금하고 둘째 육성회비 마련을 해야하는데....
막둥이 등에 달아업고 수건으로 또아리 틀어 머리에 얹어 커다란 양은 다라이 이고 나섰다.
누렁 강아지 오도방정으로 짖어대는 집 마당을 들어선다
" 아짐니~ 빵 가져왔어라~ "
" 아녀~ 오늘은 참 못내가~~ 뭐가 있어야 말이지.. "
" 구럼, 보리 한되박이라도 주면 될거아녀라~ "
" 아~따! 그냥 넘어갈라고 혔는디 그려쌌네잉~ "
" 고만치만 덜어주소~ 아짐~~!"
" 이놈 젖이라도 물리고 좀 앉았다가 갈라요~ "
" 하이고 그려~ 어린것이 뭔 고생이다냐~ 세상에 발 딛은게 고생이제~~ "
어느덧 다라이는 비워져 갔고...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듯 한데 어린것은 고개 늘어뜨려 잠들어 있고
해는 중천에 올라서 지1랄같이 앙글 거린다.
당산나무 돌턱에 땀식힐 요량으로 앉았는데,
물 한 사발 얻어 먹고 허기를 달랬는데 마지막 두개 남은 빵이 가히 유혹적이다.
망설이다 한 개를 들어 조금 떼어 입에 몰아 넣었다.
바싹 마른 입에 몰아 넣고 삼키려니 그만 사레질로 가슴을 쳐댔다.
두번째 떼어서 입에 넣는데 인기척에 앞을 보니 몇 끼를 굶은듯 동냥치가 둘이서 휑한 눈매로 바라 보고 있다.
" 옛소! 이거라도 드소~ 남은게 이게 다요.."
감사의 인삿말 할 겨를도 없이 각각 쥐어준 빵이 입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
서운한지 쳐다보는 그들에게 다라이를 들어 보였더니 뒷걸음질로 물러난다.
해가 기운 오후, 동네 어귀 점방 옆길을 들어서는데
옆구리에 가방을 낀 큰놈이 군것질하는 아이의 얼굴을 부러운듯 애처로운 얼굴로 쳐다보고 섰다.
모른척 눈돌려 집으로 돌아오는 맘이 아리고 쓰리다.
빵을 팔아 보리며 콩 잡곡들을 읍내 곡물상에서 사서 돈으로 쥐고 들어온 그래도 뿌듯한 오늘.
설겅 안쪽에 포개어 놓은 놋그릇 제기를 꺼낸다.
큰놈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두번째 걸 들어올려 며칠 모은 돈에 오늘걸 보태 놓고 다시 포개어 놓는다.
' 내일은 아침에 들려보낼수 있겠구나~ '
골골 콜록콜록~
방안에선 병든 서방의 연신 들리는기침소리를 뒤로하고 나물캐러 밭으로 나선다.
해거름. 배급나온 밀가루로 수제비 만들어 아이들 오랜만에 포식을 시켰더니 얼굴에 화색이 연연하다.
설겆이를 마치고 내일 보낼 돈을 챙겨두려 놋그릇을 당겼다.
날짜가 지나서 아침이면 울며불며 떼를 쓰는 작은놈.
그냥 공부하는 것도 죄가 되는냥 통지서만 슬그머니 마루 끝에 밀어두고 한마디 언급을 안하는 큰놈.
이제 보내 줄 수 있다는 기쁨에 포개진 놋그릇을 빼냈는데..
' 없네~'
' 분명 여기에 아까 넣었는데 '
' 발이 달려 도망갔을리 없고.. '
아차~큰놈의 점방 앞에서 처량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묻고 자실것도 없이 개나리 굵은가지 서너개 꺽어서 잎사귀 훑어 들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 너 돈 가져갔지? 배 곯고 사는 것도 서러운 세상에 도적눔 자식까지 두란말여? "
" 그돈 어디다 쓴겨~ 엉? "
" 고깟 군입정거리가 그리도 부럽더냐? "
" 이 배알없는 놈아 이놈아~ 그돈이 어떤 돈인디~~ 빨리 못가져오냐? "
쉴새 없이 내 서러운 분풀이를 하듯 종아리에 매질과 악쓰는 소리에
" 엄니~ 내가 안가져 갔어라~ 진짜여라~ "
이 말만 되풀이하며 그냥 그자리에 섰는 큰놈.
쇠심줄 고집 쓴다고 나무라며 매질에 내가 지쳐 주저 앉았다.
" 엄니~ 잘못했시유~ 근디.. 진짜여라~ "
" 용서 할거니께 그자리에 밤에 다시 남은거 가져다 놔라잉~ "
여기저기서 컹컹~ 개짖음이 유난한 밤.
화를 삼키고 아침먹을 보리를 담그려고 정지에 들어서서는 설겅에 눈길이 쏠렸다.
포갰던 놋그릇 두 개가 한쪽 구석에 멀금히 놓여있다.
큰놈 들어서는 모습에 놀라서는 다시 포개 놓는걸 잊었던 것이다.
그리고서는 없어진 줄 알고서....
이런일이...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 수건에 적시고 방안에 들어섰다.
엎드린 채 잠든 큰놈의 이불을 걷고 다리를 살피는데.
살이 터져서 피멍들고...
약도 없이 수건으로 닦아내는데 쓰린지 움찔거렸다.
" 이 미련하기가 곰같은 놈아~! "
" 그냥 니가 했다고 말하든지, 차라리 도망이라도 갔으면 이지경으로 안맞았을거 아녀
이 되야지 같은 놈아~이놈아~! "
" 어이그~ 모진놈, 내 억장이 이리 무너지는데... 닌 또 어쩌것냐? 내가 죄다~ 다... 내죄여~~ "
내 손등으로 눈물이 뜨겁게 떨어지는데
녀석이 몸을 틀어 내 무릎에 머리를 올려 팔을 감는다.
허벅지가 따뜻하게 적셔온다.
녀석도 울고 있는 것이다.
속 깊기가 어쩌면 나를 앞질러 가는 건지...
진짜 미련한 놈인지...
흐느끼는 녀석의 어깨를 다독여 그대로 무릎잠을 재운 밤
모질게 서러운 밝디 밝은 아침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 風 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