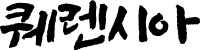봄을 캐는 아이들
아직은 한기 피우는 바람이 살랑거리고
따스한 햇살이 달게 느껴지는 이 즈음엔
옹기종기 양지바른 담벼락에 기대앉아
보리밭 할매, 남생이집 할아버지, 칠남이 할매, 그 곁에 고양이 서너 마리 고개 조아리며
햇살을 온 몸으로 마시던 광경이 연출 되었습니다.
볕 아래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 골마리 풀고 내복 허리춤 올려서
경쟁하듯 이를 잡았습니다.
설빔으로 울엄니 며칠밤을 지새며 만들어준 색동 저고리에 빨간 통치마를 입은 나.
작은 칼하나와 대소쿠리 옆구리에 끼고 쑥을 캐러 출발했습니다.
댕기머리 곱게 땋아서 반듯한 앞가르마 세우고
겅중겅중 나는듯 밟는듯 걸음을 걸으며 지나칠려면
어김없이 불러 세우고 흐드러진 노랫가락을 주문하던 노인들.
" 아리라앙~ 아리랑~ 아라리요~~오오... "
어깨춤과 함께 노래를 부를라치면 함께 덩실거리며 일어서다
그만 옷춤이 내려가 속곳이 다 드러나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통행료를 지불하듯 노래 한가락으로 골목을 지나서
큰집 포도밭을 끼고 돌면 언덕위로 모정이 보이고
모정 앞을 지나서 탱자나무 담을 지나 순이집.
순이 청자 영숙이 나물캘 준비를 마치고 와르르 몰려 나오자마자
출발 신호도 없는 뜀박질이 시작 되었습니다.
야산 언덕.
쑥도 땅두릅도 씀바귀도 이어진 천수답 논둑까지 널려 있던 곳이었습니다.
모두들 고구마나 아니면 찬밥덩이 물 한솥 부어서 끓여 먹고
그 조차도 못먹은 친구는 삶아 말린 고구마 질겅거리며 점심을 대신하였던 시절.
서로 배고픔을 줄이기 위해 말을 아끼며 나물 캐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한곳에 차분히 앉아 쑥을 캐서 깨끗이 다듬으며 담던 순이.
이곳 저곳 들쑤시고 다니며 밟고 다니던 영숙이.
이따금씩 남의 소쿠리에서 한줌씩 가져다 자기걸로 만들던 청자.
난 무얼 했을까.. ㅎㅎ
" 청자야~~~~ 일루와봐~ 얼렁!"
" 여기 큰 쑥들 디게 많어야? 얼렁와봐야~ "
냉이를 캐던 촉촉한 밭 언저리에서 제법 굵직한 지렁이 한마리를 건져올려
뒷춤에 잡고서 청자를 불렀습니다.
" 어디가 큰건디? "
" 요~~~~기!"
아무생각 없이 앉는 청자의 손등 위로 지렁이를 걸쳐 놓으니
" 으어어.. 야~ 가시네야!! 우아아앙~~ "
놀래서 주저앉아 울고.. 주저앉아 더럽힌 치마를 보며 또 울고..
눈물 글썽인 턱아래로 얼굴을 디밀면 금새 까르르 웃었습니다.
내 소쿠리엔 쑥이랑 씀바귀가 헤아릴 수 있을만큼 굴러다니고
나물 대신에 검정 말개미와 풍뎅이류의 예쁜 곤충들이
나물 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쑥을 캐기는 커녕 칼로 땅을 파고 언덕을 헤집어서 기막힌 놀이감을 발견한 나.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개미집.
도독하게 올라온 구멍 아래를 옆에서 부터 허연 알들과
혼을 빼 놓을 만큼 분주히 움직이는 개미들..
그 중에서 듬직한 한 놈을 들어서 햇볕에 비워보니
까맣기만 했던 개미가 꼼지락거리며 진보라빛으로 반짝였습니다.
' 그래 키워보는겨~ '
' 내 앉은뱅이 책상 밑에다가 엄마 몰래 키우면 되지렁~ '
어쩌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소쿠리에 있던 몇 개의 쑥들을 버리고
치렁거리게 크게 만들어 입혀줬던 고쟁이를 벗어 바닥에 깔고
개미집을 통째로 파서 흙과 함께 소쿠리에 담았습니다
개미들이 나 잡아가슈하고 가만히 있을리가 없었고..
그래도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파서 담았던 소쿠리를 들고
애들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도둑걸음으로 집으로 뛰어들어 큰방 윗목에 잠시 내려 놓고
울엄니 아끼던 대설짝을 찾았습니다.
뚜껑도 있고 대나무로 만든거니 공기도 통할거고 딱이었습니다.
한참을 곡간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요것이 뭣이여어? 흐미... "
"ㅍㄱ 아~~~~~~!! 너 이리 나와~ 빨리 안나올겨?? "
울엄니 악쓰는 소리가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졌구나.
나가봐야 할것인지 말것인지 망설이다가 저녁밥도 먹어야 겠고, 잠도 자야겠고,
힘없는 생을탓하며 토방으로 나섰습니다.
" 철썩~ "
내 엉덩이에 빗자루가 들이 엉겼고
또한번 하늘로 빗자루가 나르자 마루로 올라서 방안으로 도망갔습니다.
" 으악~ 이게 뭐여? "
" 얘들이 왜 이려? "
"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집 만들어 줄라 혔는디.."
정말로 난감한 상황.
비닐장판 방바닥에 까만 개미떼가 사방팔방으로 움직이고..
그 중에서도 알을 물고 어디든 숨을 곳을 찾아서 갈팡질팡하는 개미들...
온 방안에 개미들이 그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일줄은....
소쿠리에 담아 뛰어올때 많긴 했지만 그 정도일줄은 미처....
부랴부랴 어머니는 빗자루로 쓸어 담아내고..
"써글년~ 내속으로 났어두 저속을 알다가 모르것어.."
울엄니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난 그냥 우두커니 개미를 키우지 못한 아쉬움에 서있기만 했습니다.
' 잘 할수 있었는데..'
'집 찾아올 동안 기다려 주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날밤.
여섯 식구가 줄줄이 이불덮고 누워 잠을 청하는데..
여기 저기서 굼실굼실...
이 다리 저 옆구리서 슬금슬금..
모두들 긁고 털어내느라 깊은밤 자정이 넘도록 날 째려보며
잠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나물 캐기 금지령이 내려지고
울엄닌 칼을 모두 숨겼습니다.
그래도 또 나물캐러 나섭니다.
이번엔 소쿠리와 곡간에 걸려있는 호미를 들고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며 가다가 할머니들 앞에서 또 노랫가락 한자리로
동전 하나 받아서 옷고름에 말아 묶고서
더욱 기세등등 나물 캐러 나섰습니다.
.......
울꼴통 1학년 적
아침 9시 30분이 되어서 학교 선생님께 걸려온 전화.
" 아직도 아이가 학교에 안왔어요. 찾아서 보내주세요~ 부탁합니다."
애처로운 선생님의 여린 목소리였습니다.
출근길에 차를 돌려 부랴부랴 찾아 나섰는데..
아파트 사이 화단, 나무 아래서 말라죽은 삭정이들을 주워다가
연필 세 개를 몰아 쥐고서 땅을 파고는 하나씩 심고있지 뭡니까?
화를 삼키며 던진 질문.
" 학교 가다가 지금 뭐하냐? "
" 나무 심어요 "
" 무슨나무? 그렇게 심으면 살아날것 같냐? "
" 네~ 봄에는 뭐든지 살아난다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
" 그건 무슨 나문줄 알어? "
" 몰라요~ 근데요~ 돈나무로 키울거에요~ "
" 돈나무라니~ "
" 돈하고 같이 심고 있거든요.. 보세요~ "
꽂았던 삭정이를 파내고 보여주는는데 100원짜리 동전이 묻혀 있었습니다.
" 돈이 열리면 다 따서 엄마 드릴께요~~ "
" 일단 지각했으니 학교 부터 가고 저녁에 엄마랑 얘기하자 알았지? "
학교로 향하는 아들녀석을 보내고 나를 닮아가는 녀석을 생각하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나무 아래서 쭈그려 앉아
삭정이 밑을 파서 동전들을 꺼내고 있는데..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 왈.
" 아짐~~ 그 막가지 심고 있소? 내참~ 다 죽은가지잖여요~ 잘 살펴봐여~ 별~~~ 정신없는 아짐 다보것네."
" 쓸데없는짓 허덜말구 집에가서 청소나 하소!
'우~~~~~~쒸'
변명 한 마디 못했습니다.
= 風 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