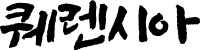상처와 망각에 대해서
-- 시인 김소연님의 글에서 ---
/// 흔적
상처가 상흔이 되고, 상흔이 다시 흔적이 된다. 흔적에는 그 어떤 통증도 없다. 아픔이 배제된 상태이며 그 어떤 조명도 비춰지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흔적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기억하고자 하는 욕망도 사라지고, 기억되는 것들과도 거리를 둔다. 다만 남아있는 것들. 상처 준 것들에 의해 상처 입은 존재가 어느 새 변해져 있는 것. 무언가를 이미 반영하여 존재가 변형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갈해졌을 수도 있고 훨씬 일그러져 있을 수도 있지만, 변해버린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흔적은 없어지지 않는다. 네가 필름처럼 영혼 속에 저장되어 있다. 얼마나 너절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확인되어지지 않는다. 추억에는 온도가 있지만 흔적에는 온도가 없다. 추억에는 추억하는 자의 눈에는 보이는 미장센이 있고 추억하는 자의 후각에만 잡히는 향기가 있고, 들리는 소리들이 있지만, 흔적에는 아무 것도 없다. 추억 때문에 추억하는 자는 마음을 열고 문을 내지만, 상처 때문에 상처 입은 자는 마음을 닫고 벽을 쌓지만, 흔적 때문에 흔적을 간직한 자는 집을 버리고 길을 걷는다. 추억은 우리를 환속하게 하고, 상처는 우리를 은둔하게 하며, 흔적은 우리를 탈속하게 한다.
(굿맨 주) 미장센 Mise en scene : 불어로 연출이란 뜻이며, 때로는 특수한 장면의 배우들의 위치를 의미하기도 함.
/// 망각
기억하는 자와 추억하는 자에 의해 애초부터 버려지는 편집의 찌꺼기들도 망각이라 부를 수 있지만, 이미 편집된 기억과 추억과 상처들도 곧 망각이라 부를 날이 도래한다. 망각은 저 뒤에 남아 있는 마지막 불빛과도 같지만, 생의 길모퉁이를 지나가는 내내 우리와 함께 한다.
추억도 상처도 밤길의 어느 한 모퉁이 가로등처럼 빛을 낼 뿐, 대부분 칠흑과도 같은 망각이 우리와 동행한다. 망각의 도시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다. 셧터를 내린 상가만이 길가에 가득하다. 그러나 셧터 내린 상가 안쪽에는 상점에 딸린 방에 들어가 코를 고는 사람이 있고, 밤새워 켜놓은 텔레비전의 푸른 불빛도 있다.
그러므로 망각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주 간단한 촉매로 인해서 또다시 화학 작용이 일어나곤 한다. 암세포처럼 완치되었다고 믿는 그 이후부터 어디엔가로 전이될 궁리를 할 때도 많다. 그리하여 시한부의 선고를 받거나 사망 진단서를 받게 되는 그 순간까지, 끝없는 세포 분열을 한다.
망각의 세포 분열은 망각한 자가 의식하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우리가 버린 물건들이 우리 곁을 떠나서 독자적인 행보를 갖고 다른 모퉁이의 다른 손길에게 다가가며 돌고 돌듯이, 우리가 버린 기억들도 우리 곁을 떠나서 저 혼자만의 행보를 갖고 전혀 엉뚱한 모퉁이에서 우리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넨다.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따라가고 싶기도 한, 망각했던 기억들은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느라, 버려진 장롱처럼 시커멓게, 우두커니 서 있다.
시인 김소연 - '마음사전 중' '지나간 것들에 안부를 묻다' 에서 인용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