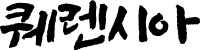여린 마음 하나 오늘도 이렇게 서성입니다.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같은 시간.
같은 크기로 다가오는 그리움이란 친구를 벗 삼았지만
곁에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있는데...
습관인지 버릇인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앞에
두팔 벌리고 서 있는 크고 작은 기억들이
왜 이처럼 나를 반기려 하는건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깊은 마음의 크기를
내려두어야 아직도 난 그대라는 그림자 아래로
숨어들 수 있을런지.
시간이 흐르면 담아 두었던
감정도 변해 버린다는 말 아니 옅어 질거라는 그 말
모두가 거짓이란 것을 난 어쩌면 그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눈 뜨고 맞은 이 새벽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어렴풋이 꿈에서 덜 깨어 부시시한 얼굴로
눈 비비듯 푸석 푸석한 얼굴을 투명한 거울 속에 담고
그 안에서 웃음 짓는 나를 만나 또 그렇게
푸념어린 이야기들을 가슴속에 담아두게 되겠지요.
눈을 뜨고 잠에서 깨었을땐 하얀 눈이라도 펑펑 내렸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픈 마음도 기쁜 마음도 잠시 잠깐 묻어두고
처음에 가져 보았던 설레임, 그리움, 그리고
기쁨이 늘 영원하기를 바라고 픈 마음으로
여기에 이렇게 새벽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이른 아침의 정적을 벗삼아 자욱히 깔린 뽀얀 안개처럼
그렇게 그리움 하나 묻어두고 내 작고 보잘것없는
여린 마음 하나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성입니다.
눈 뜬 아침도 환한 웃음 머금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대 가까이에 서성이는 하루의 시작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