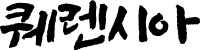우체통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a4용지의 크기만한코네에 꽃그림이 희미한
문방구에 갓 사온 꽃 편지지에 파란 모나미 잉크로
정성스레 편지를 쓰고
잉크가 마르기를 기다려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이고 풀로 봉투를 봉한 뒤에
동네 어귀까지 걸어가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으면 우체통 바닥으로
편지가 '털썩'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곤 했었다.
요즘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놓고 적어도 사나흘은 지나서야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애틋한 기다림의 시간들로 인해 사랑은 또 얼마나 깊어졌던가
긴 겨울이 지나고서야 새 봄이 오듯이 그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렵사리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급하지 않는 자연의 성품을 닮아
갈 수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 그 시절 음악에 대한 목마름은 또 어땠는가.
요즘은 'mp3'라고 불리는 손가락만한 크기에 복제능력이 탁월한
마술 같은 기계가 등장하여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무한정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통해서나 듣고 싶은
노래를 겨우 접할 수가 있었다.
그래도 졸음을 참아가며 기다린 덕분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신청곡을
사연과 함께 듣고 있노라면 얼마나 마음이 달뜨고 행복했던가.
그 가난했던 시절, 빈곤 속의 풍요를 음악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허스키한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가는 디제이의 밤을 잊은그대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